겨울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얼음 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길을 걷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스케이트를 타다 균형을 잃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
“왜 얼음은 이렇게 잘 미끄러질까?”
차갑고 단단한 얼음 위에서 우리가 미끄러지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막의 정체
우선, 얼음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스케이트날처럼 뾰족한 도구나 발바닥처럼 좁은 면적이 얼음에 닿으면, 강한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압력은 얼음의 녹는점을 낮추어, 아주 얇은 물층이 생기게 하지요. 이 현상은 ‘압력에 의한 용융’이라고 불립니다.
이 물층은 너무 얇고 투명해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물막이 얼음을 미끄럽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우리는 사실 얼음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물 위를 미끄러지는 것과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마찰의 열, 미끄러움에 한몫 더하다
게다가 움직일수록 얼음은 더 미끄러워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걸을 때나 탈 때 생기는 마찰이 얼음과 접촉하면서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열은 얼음을 살짝 더 녹여 물층을 두껍게 만들고, 결국 더 미끄럽게 만듭니다.
즉, 움직임 자체가 얼음 위의 미끄러움을 가속시키는 셈이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미끄러운 이유
하지만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기엔, 압력이나 마찰만으로는 얼음을 녹이기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도 얼음은 여전히 잘 미끄럽습니다.
왜일까요?
과학자들은 얼음 표면에 항상 존재하는 **초박막의 준액체층(quasi-liquid layer)**을 밝혀냈습니다.
이 얇은 층은 얼음이 가진 고유한 성질로, 극저온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얼음이 원래부터 미끄러운 코팅을 갖고 있는 셈이죠.
결국, 우리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건 기온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적인 미끄러움 덕분입니다.
빙판길을 마주할 때
다음 번에 얼음 위를 걸을 일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는 과학의 법칙들을 떠올려 보세요.
단단해 보이는 얼음은 사실 보이지 않는 얇은 물막과 열, 압력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표면입니다.
과학을 안다고 해서 넘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왜 넘어지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겨울철 빙판길은 조심, 또 조심!
이해를 돕는 짧은 동영상도 준비했어요!
재밌고 쉬운 과학,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보세요! 🎥✨
https://youtu.be/YcQUkdj6WJU?si=8OcHJ66l1q9-TfS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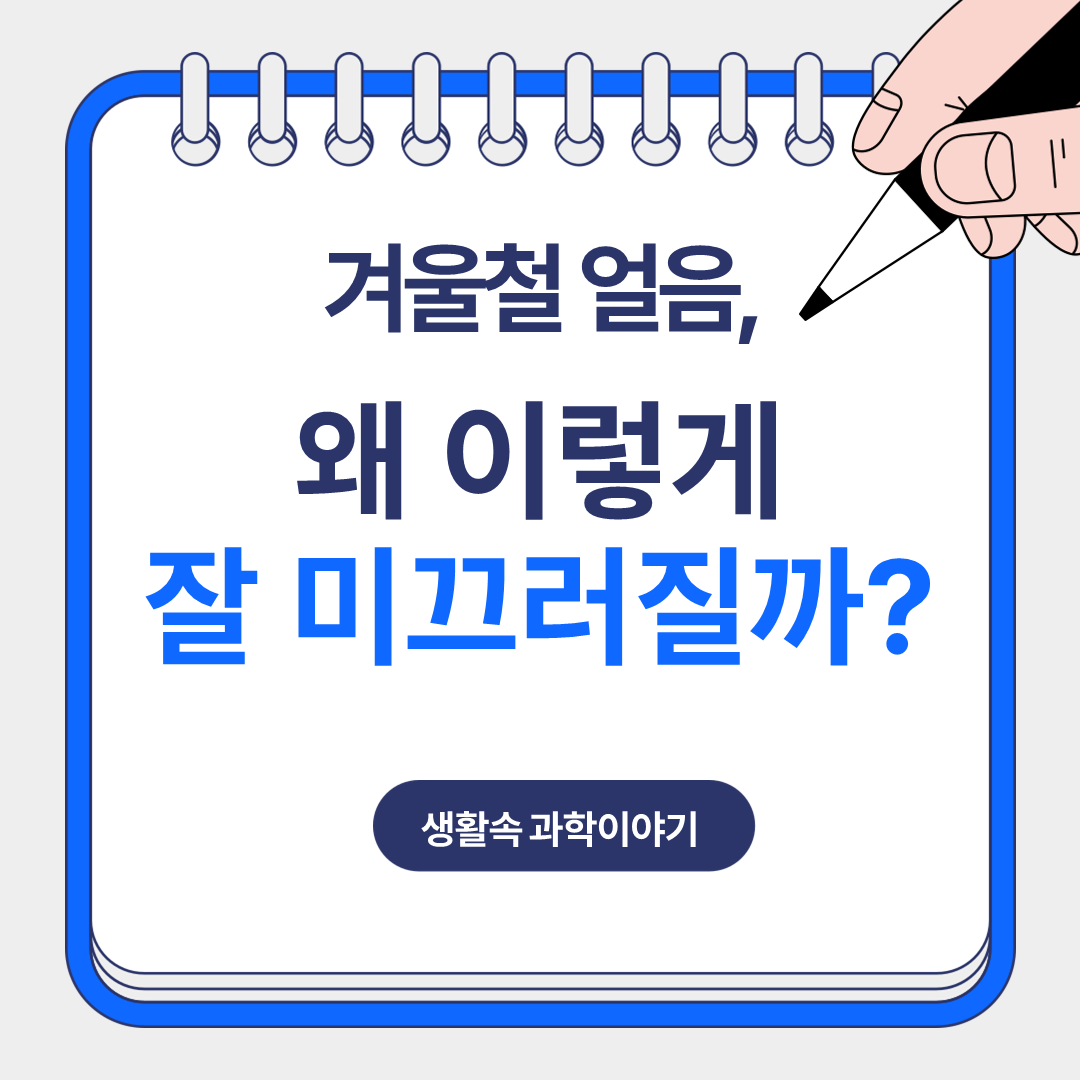
'과학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람이 생기는 원리, 간단 정리! (1) | 2025.08.12 |
|---|---|
| 소의 소화 시스템과 메탄가스 생성 원리 (3) | 2025.08.10 |
| 저녁 무렵 하늘은 왜 붉게 물들까요? (1) | 2025.08.08 |
| 고랭지 배추밭의 비밀, 돌멩이가 물을 만든다고? (3) | 2025.07.28 |
| 꽁꽁 언 호수 밑 물고기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3) | 2025.07.28 |



